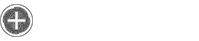신앙칼럼_소설 주문모 小說 周文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1회 작성일 21-05-06 09:42본문
저녁 7시. 노트북 모니터 하단에 노란색 불빛이 깜박거린다. 분명 원고를 독촉하는 메시지일 것이다. 창문 너머로 세상을 본다. 모두들 참 바쁘다.
1801년 5월 한양. 어스름한 귀퉁이를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접어들고 있었다. 현계흠(플로로, 약재상)과 손경윤(제르바시오, 약재상)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음을 서둘렀다. 목 뒷덜미에 땀이 촉촉해져 올 무렵, 그들은 골목 막다른 곳 사립문 앞에 멈춰섰다. “저희들이 왔습니다. 계십니까.”
대청에서 가부좌 틀고 호롱불에 의지해 책을 읽던 김종교(프란치스코, 의원)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급히 일어섰다. 그 때문에 마루가 삐걱거렸다. 김종교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앞으로 바짝 몸을 당기며 다급하게 물었다.
“탁덕(주문모 신부)께서는 어찌 되었는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입을 열다가, 말과 말이 부딪히자 동시에 말을 멈췄다. 잠시의 말 머뭇거림이 있었고, 결국 현계흠의 눈짓 양보로 손경윤이 말했다.
“탁덕께선…. 참수 당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사이로 호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큰 박해가 일어났고, 천주교 신자들이 줄줄이 잡혀갔다. 신자들을 살려야 했다. 주문모 신부는 결심했다. 스스로 걸어서 의금부로 갔다. 경비를 서던 포졸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주 신부가 대답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주문모가 바로 나요. 죽음을 청하러 왔소. 내가 수장이니, 다른 사람들을 석방해 주시오.”
심문 끝에 명이 떨어졌다. 사형! 주 신부는 곤장을 맞았다. 걸을 수 없어 주 신부는 들 것에 실려서 형장으로 끌려갔다. 지친 주 신부의 눈에 길거리 구경꾼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주 신부가 그들을 향해 힘겹게 손 뻗으며 말했다. “목이 마릅니다….” 한 군졸이 사발에 막걸리를 담아왔다. 주 신부가 조금 기력을 찾는 듯 보였다. 군졸들은 다시 길을 재촉해 주 신부를 형장까지 끌고 갔다. 새남터였다. 마지막 순간…. 주 신부가 말했다. “나는 천주교를 위해 죽습니다.”
한 군졸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허락했다. 그러자 주 신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큰 칼이 큰 반원을 그리며 위에서 아래로 큰 선을 그리며 떨어졌다. 그 떨어짐과 동시에 주 신부의 머리도 툭 떨어졌다. 1801년 5월 31일 삼위일체 대축일, 신시(辛時, 오후 6시30분~7시30분)의 일이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짙은 구름이 몰려왔다. 거센 바람이 일었고, 천둥이 우르릉거렸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흙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잠시 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걷혀졌다.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것은 참혹한 아름다움이었다.
호롱불이 조금 흔들렸다. 현계흠과 손경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종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천주교는 20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종교가 말했다. “진리는 힘을 잃지 않는 법이네.”
김종교, 현계흠, 손경윤…. 이들도 그 해 겨울 문턱에 주 신부의 뒤를 따라 갔다.
저녁 7시 30분. ‘파일 올리는 중’ 창이 잠시 뜨더니 순식간에 원고가 웹하드 폴더 속으로 들어간다. ‘전송 완료.’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어스름하게 잡혀가고 있었다. 달아올랐던 몸도 서서히 식고 있었다.
오는 주말에는 새남터에 갔다 오려 한다. 한강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9.1매
* 이 글에 등장하는 주문모 신부, 김종교(프란치스코), 현계흠(플로로), 손경윤(제르바시오)은 신유박해(1801)때 순교했으며, 2014년 8월 16일 교황 프란치스코 주례로 한국에서 복자위에 오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